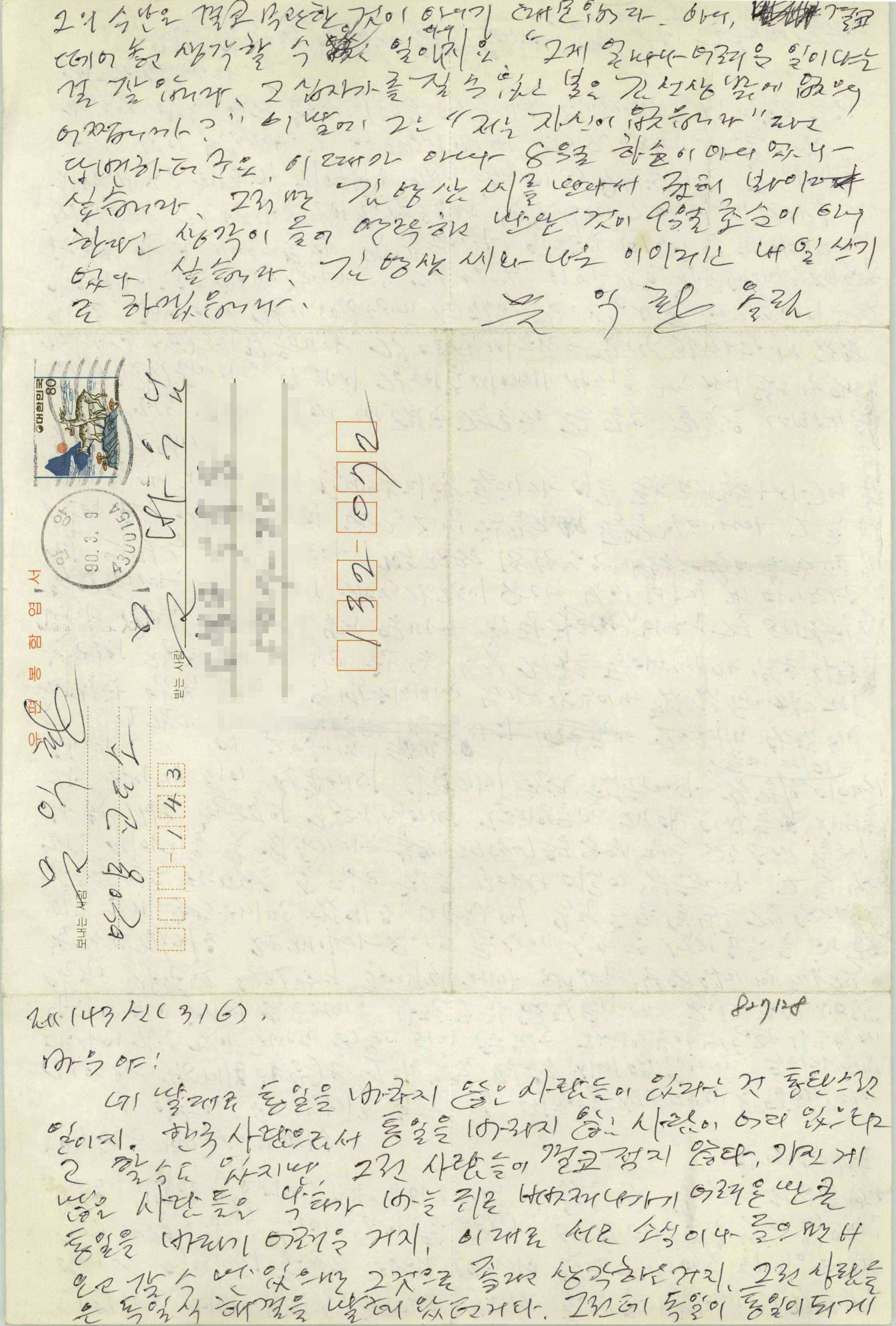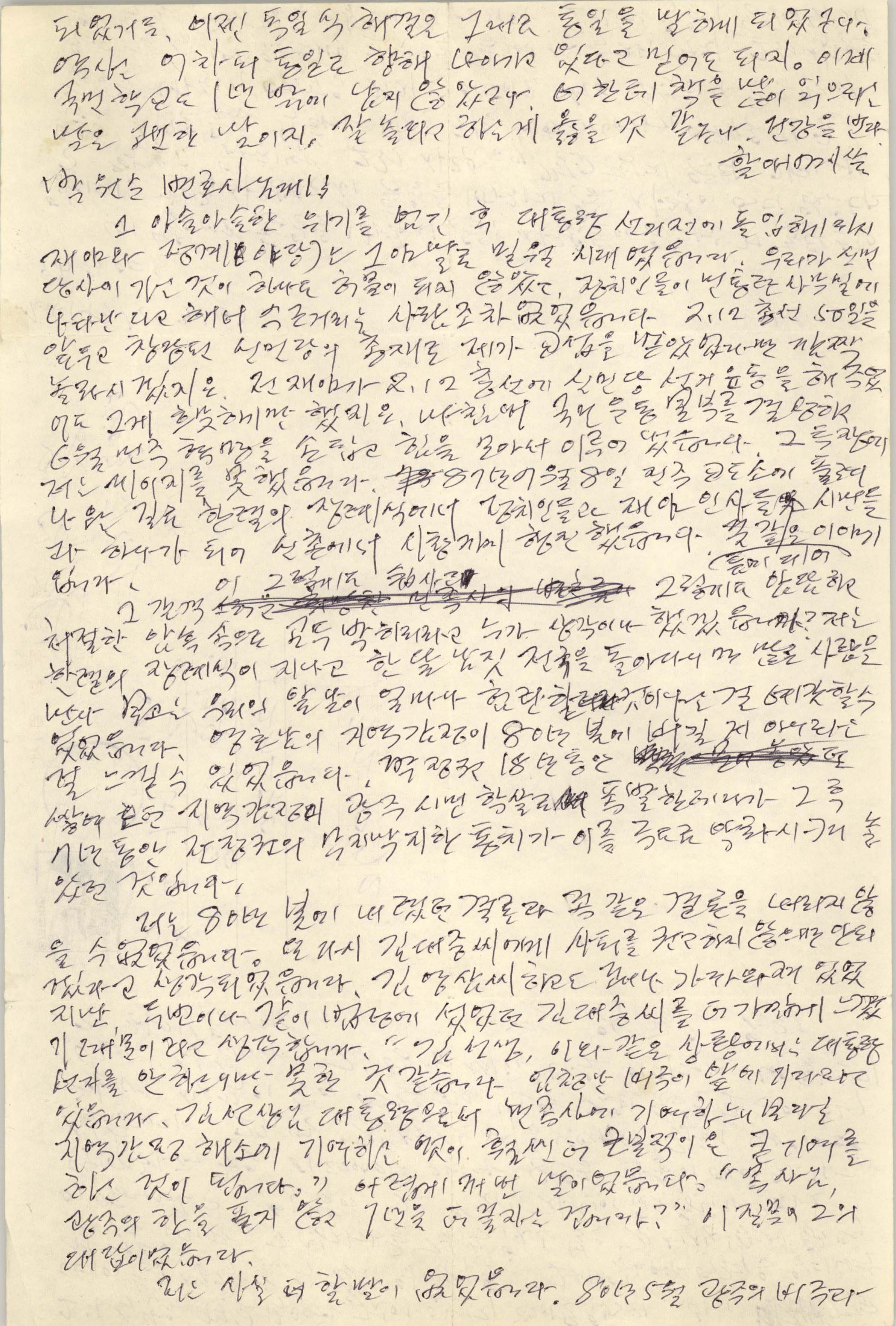어려운 지역감정 해소와 후보 단일화 -첫째 이야기
바우야
네 말대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통탄스러운 일이지. 한국 사람으로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만큼 통일을 바라기 어렵지. 이대로 서로 소식이나 들으면서 오고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은 독일식 해결을 말해 왔지.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거든. 이젠 독일식 해결은 그대로 통일을 말하게 되었구나. 역사는 어차피 통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도 되지. 이제 초등학교도 1학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너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괜한 말이지, 잘 놀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구나. 건강을 빈다.
할아버지 씀
박원순 변호사께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후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기까지 재야와 정계(야당)는 그야말로 밀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신민당사에 가는 것이 하나도 허물이 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민통련 사무실에 나타난다고 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2.12 총선 50일을 앞두고 창당된 신민당의 총재로 제가 교섭을 받았었다면, 깜짝 놀라시겠지요. 전 재야가 2.12 총선에 신민당 선거 운동을 해 주었어도 그게 흐뭇하기만 했지요. 마침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 민주 혁명을 손잡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투쟁에 저는 끼지를 못했습니다. 87년 7월 8일 진주 교도소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이한열의 장례식에서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 틈에 끼어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신촌에서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렇게도 암담하고 처절한 암흑 속으로 곤두박이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한열의 장례식이 지나고 한 달 남짓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 보고는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 것이냐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80년 봄에 비길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정권 18년 동안 쌓여오던 지역감정이 광주 시민 학살로 폭발한 데다가, 그 후 7년 동안 전두환 정권의 무지막지한 통치가 이를 극도로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80년 봄에 내렸던 결론과 꼭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김대중 씨에게 사퇴를 권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삼 씨하고도 꽤나 가까워져 있었지만, 두 번이나 같이 법정에 섰던 김대중 씨를 더 가깝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대통령으로서 민족사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요,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광주의 한을 풀지 않고 7년을 더 끌자는 겁니까?” 이 질문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그의 수난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김 선생밖에 없으니 어쩝니까?” 이 말에 그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더군요. 이때가 아마 8월 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씨를 만나서 권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하고 만난 것이 9월 초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영삼 씨와 나눈 이야기는 내일 쓰기로 하겠습니다.
문익환 올림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김대중 씨를 만났던 이야기를 기술